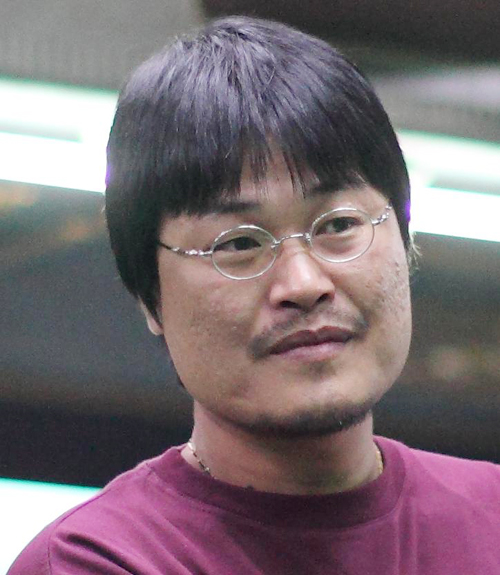
내가 본 황해, 그 ‘누런 바다-황해’는 대체 무엇인가. 자연적ㆍ지리적 공간으로서의 그 망망(茫茫)한 바다가 하나의 문화적ㆍ정치적 공간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버린 것은 아닐까.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들이 그물[網]을 이루고, 그 그물에 또 다른 그물[網]이 더해져 망망(網網)해져 버린 그 바다. 서해(西海)가 아닌 황해(黃海)이기에 가능한 해석이다.
그 바다를 ‘서해’라고 명명할 때 생겨나는 상징적 힘이 있다.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‘서해’가 갖는 상징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다. 2002년의 ‘서해해전’, 작년의 ‘천안함 사건’과 ‘연평도 포격사건’ 등이 공통적으로 맞닿아 있는 맥락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닌가. ‘언급의 불필요성’은 한 사건이 이미 역사적 무게를 획득하고 있다는 증거다. 반면에 ‘언급의 필요성’이 제기되고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. 바로 사건들이 역사적 무게를 획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그러하다. 공교롭게도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온 2010년이라는 시기는 그 바다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던 시기다. 아마도 감독은 일반적으로는 ‘서해’라고 불리는 그 공간을 여태껏 다루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정황에서 언급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듯하다. 그래서 ‘황해’라는 제목을 붙였을 것이고, 따라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인 ‘황해’라는 그 바다는 앞서 말한 ‘서해’와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. 그 바다를 ‘서해’가 아닌 ‘황해’로 바라볼 때 생겨나는 역사적 무게를 획득하지 못한 사건들을 언급할 필요가 감독에게는 있었던 것이다.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질문 하나: 누렇디누런 그 바다에서, 또 ‘그’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. 이 질문을 통해 이제 나에게 황해는 더 이상 ‘그’ 바다가 아닌 ‘이’ 바다로 다가오기 시작한다. 영화 ‘황해’는 나에게 ‘이’ 바다의 공간적 전도(顚倒)를 이야기하기에 이른다. 영화는 김구만과 면정학, 그리고 김태원, 이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시간, 하지만 ‘황해’라는 공간을 통해 복잡다단한 그물을 형성하는 그 시간, 그들의 몸에 새겨진 ― 누런 양피지와도 같은 ― 삶의 기록물로서의 시간을 계보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‘황해’라는 이 공간을 끊임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.
영화는 네 도막으로 나뉘고, 각 도막에 붙여진 말들이 있다: 1. 택시운전수, 2. 조선족, 3. 살인자, 그리고 4. 황해(黃海). 그리고 얼핏 봐서는 뚜렷한 연결고리가 없는 듯해 보이는 이 말들을 이어주는 한 단어, ‘디아스포라(Diaspora)’: “‘디아스포라’는 이산(離散)을 뜻하는 그리스어로, 원래 유대인의 민족적 이산상황을 뜻하는 용어였지만, 현대에서는 전쟁과 식민지화로 고국을 등져야 했던 난민이나 인민 그리고 그 후손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”(네이버 지식사전). ‘황해(黃海)’는 바로 디아스포라의 시공간이다. 한국사회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자(自)와 타(他)의 경계들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차별의 공간들을 역설적으로 비유하는 시공간. 그리고 이 ‘누런 바다’는 바로 나, ‘누런이(黃人種)’가 살아가는 공간에 다름 아니다. 내가 나를 ‘누렇다’고 부르기까지 작용했던 서구중심적 타자화의 논리(Orientalism)와 이 사회에 있는 나를 ‘택시운전수’ 또는 ‘살인자’라고, 또 연변에 있는 나를 ‘조선족’이라고 부르기까지 작용하는 자기타자화의 논리(Self-Orientalism)가 무엇이 다른가. 김구남, 면정학, 그리고 김태원. 그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나의 자화상이었다.
수많은 경계들이 나누고 만들어내는 차별과 선입견, 그리고 편견의 공간들. 그리고 그 공간들에 새겨져 있는 시간들. ‘황해(黃海)’에 비치는 내 몸에 살아 숨 쉬는 시공간의 모습이다.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